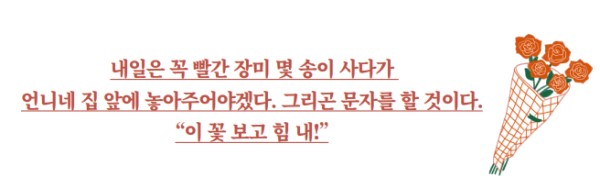전 국민 행복찾기 에세이 공모전 1등
2020년, 우리는 유달리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며 심신이 많이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투머로우는 마음쓰기 에세이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마음에서 어려움을 이기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듯, 공모전 글쓰기를 통해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감사와 행복을 찾길 바라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때문에 문제를 겪었지만 극복한 사연, 코로나19 덕분에 일상의 행복을 발견한 사연,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며 찾은 희망의 글들이 편집부로 속속 날아왔습니다.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부디 올해에는 독자 분들께 좋은 일,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마음쓰기 공모전에서 1등을 수상한 장미자 님의 에세이를 소개합니다.
옆집 언니 얼굴 본 지가 꽤 오래 된 듯하다. 코로나19의 창궐로 여기저기서 감염자가 속출하면서부터니까 족히 수개월은 지났다. 옆집 언니는 나이 예순이 갓 넘었고, 남편과는 오래 전 사별했으며, 자녀 셋 모두 출가시킨 뒤로 혼자 살아왔다.
작년까지 작은 식당을 하다가 그만두고 잠시 쉬는 중이었다. 어쨌든 언니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교대로 네 집 내 집을 들락거렸다. 커피를 마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우린 늘 허물없이 함께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다섯 걸음만 떼면 서로의 집이건만 딱 두절이 된 것이었다.
몇 달 전, 그러니까 언니네 집에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의 일이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언니가 좋아하는 옥수수빵을 발견하고 내 집보다 먼저 언니 집 초인종을 눌렀다. 그러나 현관문을 여는 언니의 낯빛은 그다지 좋지 않아 보였다.
‘늘 환하게 웃던 언니였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무튼 언니는 집안인데도 마스크를 끼고선 내가 현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손소독제부터 나에게 들이밀었다.
언니의 그런 행동에 심기가 상해버린 나는 대번 소릴 버럭 질렀다. “내 손에 뭐 똥이라도 묻었을까봐 이러는 거야?” 그러자 언니는 일단 손부터 소독하라며 손소독제를 내 턱밑까지 가져다 댔다. 그리곤 얼굴을 찡그리며 내가 손을 소독하고 나서야 커피 한 잔 하라며 주방 식탁으로 나를 오라 했다.
갓 내린 원두커피를 마시며 우리 둘은 코로나로 떠들썩한 뉴스로 자연스레 시선이 갔다. 나는 또다시 TV를 향해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으이구, 뭔 난리들이래? 운 좋으면 안 걸릴 것이고, 운 나쁘면 걸릴 건데 뭘. 난 오십 평생 살아왔어도 저런 건 한 번 걸려본 적이 없는데. 유난 떠는 사람들이 더 잘 걸리지. 쯧쯧쯧!”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르게 장황스런 내 말에도 언니는 조용했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신 후에야 언니는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했다.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우리 가급적 오가지 말도록 했으면 해. 난 오래 전 사스며 신종 플루며 메르스 때도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질 않았어. 전염병 이런 데에 내가 좀 많이 예민하거든.”
나는 대번에 화가 났다. 꼭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옮겨 올 사람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흥! 어지간히 별나네. 알았어. 그럼.”
나는 두 말없이 딱 잘라 말하곤 언니네 현관문을 쾅 닫고 내 집으로 와버렸다.
집에 와서도 분이 풀리지 않던 나는, 반대편 옆집 할머니 댁으로 갔다. 이 할머니 역시 평소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할머니 댁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호들갑을 떨며 떠들어댔다.
“1007호 언니 왜 그런대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서로 보지 말자 합디다. 뭐 이런 전염병이 돌 때는 절대 집 밖으로 안 나온다나 어쩐다나. 흥! 어디 두고 보라지.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 줄 알고 허구한 날 집 안에만 답답해서 어찌 있을 거냐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허허 웃으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나한테도 같은 말 하더라. 누가 해다 주는 반찬도 겁이 나서 싹 다 버린다더라고. 그래서 나도 알았다고 했다. 그러려니 해라. 자기 몸 유별나게 위하는 사람들 있지 않더나. 지네 딸들도 절대 못 오게 한다더라.”
흠... 그렇다면 분명히 엊그제 내가 가져다준 그 많은 열무 물김치도 통째 배수구로 버렸을 것이다. 나는 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고 저러니 반찬은 앞으로 가져오지 말라고 하던가. 그래그래, 본인 몸 그리 끔찍이 위하면서 천 년 만 년 어디 한번 잘 살아보시오.
그리고 약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다. 친구와 밖에서 술 한 잔 알딸딸하게 마신 나는, 우리 집 문을 열다 말고 냉큼 옆집 언니네 초인종을 눌렀다. 언니는 인터폰에 대고 무슨 일이냐 물었고, 나는 어서 문 열어보라며 성화를 부렸다. 잠옷 바람으로 문을 연 언니 얼굴은 전과 똑같이 마뜩치 않아 보였다. 나는 언니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먼저 선수를 쳤다.
“아, 알았다고! 손 소독부터 하면 되잖아!”
언니는 야밤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멀뚱거렸고, 나는 거실 바닥에 퍼질러 앉아 하극상마냥 손짓을 까딱하며 언니더러 와 앉으라 했다. 언니가 앉자마자 나의 속사포는 시작되었다.
“아니,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도 그렇지. 어디 언니만 깨끗하고 나는 코로나 감염자야? 웬 유난이래? 진짜 많이 서운하다. 우리가 어디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말이야.”
언니는 내 말을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몇 분이 지나서야 언니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시작했다.
“그래, 네 입장에선 서운했겠지. 하지만 또 내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딸만 셋을 내리 낳고 아들을 낳았었지. 귀한 아들 손자를 이제야 낳았다고 시어머니는 돼지를 잡아 동네잔치까지 하셨어. 그런데 그 아이는 네 살이 되던 해 콜레라에 감염되어 그만 죽어버렸지. 시골에 살 때니까 차가 있길 했나 어디. 구토와 설사를 해대는 아이를 업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뛰어가는데 그때의 내 심정은 아무도 몰라. 생살을 칼로 도려내서라도, 몸 속 피를 전부 빼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만 있다면 했지.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게 아이는 그만.... 그 아이를 잃어버린 것이 나는 평생 한이란다.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전염병이란 말만 들어도 여태껏 소름 끼치고 심장이 벌렁거리지. 그러니까 서운해 하지 말고 코로나 종식 될 때까지만 나를 좀 이해해줘.”
언니의 말을 들은 나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언니더러 별나다는 둥 유난스럽다는 둥 했으니. 게다가 운 좋으면 안 걸릴 것이고, 운 나쁘면 걸릴 거란 말도 거침없이 지껄여 댔으니. 아, 언니는 이런 내 말들에 얼마나 또 상처가 되었을까. 술이 확 깬 나는 언니에게 사과했다.
“언니, 정말 미안해. 그런 아픈 일이 있었던 줄도 모르고.... 그래, 코로나 종식 될 때까지는 언니 말 듣고 조심할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문자나 전화로 하면 되니까.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아무튼 집안에만 있더라도 밥 잘 챙겨 먹고 신나는 음악도 들어가며 너무 우울하게 있지 마. 언니 알았지?”
이런 내게 언니는 따뜻한 웃음을 지어주었다.
꽃을 워낙에 좋아하는 옆집 언니.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도 온 지 오래건만, 아마 언니네 집엔 몇 개월 째 꽃 한 송이 화병에 꽂혀 있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꼭 빨간 장미 몇 송이 사다가 언니네 집 앞에 놓아주어야겠다. 그리곤 문자를 할 것이다.
“이 꽃 보고 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