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친구
가족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같이 슬퍼지고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내 마음도 기쁨으로 출렁이는 그런 신기한 사이, 그게 친구가 아닐까요? 이번 호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고민도 스스럼없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친구와 나는 사는 곳이 멀어 자주 볼 순 없지만 전화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이런 원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서로 미워하다가 어느 한 사건으로 인해 지금은 죽마고우가 되었다.
8년 전 나는 동부아프리카 ‘부룬디’로 해외 봉사를 떠났다. 그때 함께 활동했던 동료가 바로 앞서 말한 친구, ‘김찬미’이다. 부룬디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던 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친구랑 1년간 잘 지내야지!”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달리, 지내면 지낼수록 서로 다른 가치관이 부딪혀 많이 싸웠다. 친구가 미우니까 친구가 하는 크고 작은 행동 모두가 미웠다. 잠도 같이 자기 싫었지만, 방은 하나에 모기는 어찌도 많은지 한 모기장 안에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맞대며 자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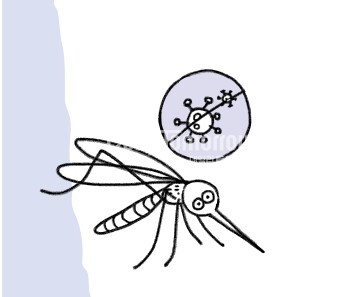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아침 청소를 하려고 빗자루를 드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하고 돌았다. 나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온몸에 힘이 없고 열은 끝없이 올랐다. 그렇다 보니, 친구가 내 청소 구역까지 담당을 해주었고 나는 그저 계속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나를 위해 친구는 수건을 물에 적셔 머리부터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닦아 주었다. 그 덕에 나는 다음 날 열이 떨어져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만약 찬미가 아팠다면, 나는 과연 밤새워 간호할 수 있었을까?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며칠 뒤 병원에 간 나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그렇게 열이 나고 아팠음을 알게 되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만든 테두리 안에서만 살았다. 누구든 내가 만든 경계를 넘어가면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말라리아 덕분에 찬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처음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서로에게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것은 서로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종종 싸웠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찬미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다. 그 연결고리는 아프리카 산 모기가 맺어준 것으로, 그 끈은 한국까지 따라와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예정이다.
“우정을 불러다 준 부룬디 모기야 고마워!”
글|김소은
물리치료사로 일하며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한다. 언젠가 부룬디로 다시 돌아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할 날을 꿈꾼다.

